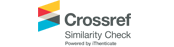I. 서론
수술실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탈적 사건1)들이 모여 결국 모든 전신마취 수술에 대해 수술실 영상감시(이하 CCTV)를 강제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사건의 중심에는 ‘대리수술’이 있다. 환자에게 ‘사전에 동의받지 아니한 자에 의한 수술’을 의미하는데 학술 논문과 언론 보도 속에는 유령수술, 의사 바꿔치기, 그림자 의사 등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여 이를 정의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다. 동시대 한국 의료현장의 대리수술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 단어로 묶는 것도 무리가 있다. 이를 대리수술의 목적(영리, 효율, 교육)과 대리 주체(비의료인, 간호사, 전공의, 전임의, 타전문의)에 따라 분류하고 설명하려 한다. 또한 의료 현장에는 명백한 불법적 대리수술과 정상적인 수술 사이의 회색지대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전공의 수술 참여가 그러하다. 특히 대학병원에서 교육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공의 수술 참여는 수술실 영상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 정상적인 외과 교육과 대리수술 사이에서 갈등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전공의 수술교육과 관련하여 선행된 외국의 사례와 지침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의료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침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대리수술에 대한 정의는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를 설명할 때 서구의 문헌에는 ‘unauthorized’, ‘not hired’, ‘not informed’, ‘unknown’ 등의 중심 단어가 포함되고 국내 문헌에는 ‘동의’ ‘약속’ 등이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다. 종합하면 대리수술은 ‘환자의 동의를 벗어나 모르는 사람에 의해 수행된 수술’로 정의된다. 황만성은 2015년의 저술에서 대리수술의 개념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였는데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넓은 의미에서의 대리수술은 진료행위자와 수술행위자가 상이한 경우를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행위자가 상이하며 동시에 동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1]. 이를 서구의 표현과 연결하면 넓은 의미는 not informed 혹은 unknown에 해당하며 좁은 의미는 이와 함께 unauthorized 혹은 not hired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술 시 ‘의사를 대체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를 살펴보고자 한다.2)) 여러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데 ‘대리수술’, ‘유령수술’이 많이 사용되고 간혹 ‘의사 바꿔치기’, ‘그림자 의사’ 등도 간혹 쓰여왔다[1]. 같은 용어가 상황에 따라 다른 뜻으로 쓰이고, 때로는 다른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여 적확한 용어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론을 통해 살펴보면 서양의료가 도입된 직후부터 수술 행위를 넘어 진료 전반에 걸쳐 ‘부정(不正) 의사’와 관련된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이를 가리키는 몇 가지 호칭들이 사용되었다. ‘무면허 의사’, ‘가짜의사’, ‘대리진료’ 등이 수술실 이외의 무면허 진료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는데 순서로 치면 무면허 의사 용어가 먼저 나타난다. 1924년 9월 19일 동아일보 기사 “無免醫師取調” 기사에서 병원 조수(助手) 출신의 일본인이 세브란스 의원의 의사를 사칭한 사건을 보도하며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가짜의사가 나타나는데, 1927년 12월 14일 조선일보의 “金品詐欺專門(금품사기전문) 가짜의사 톄포” 기사에서 가짜의사, 거짓의사 용어가 함께 사용된다. 1931년 10월 13일 조선일보 기사 ‘가짜醫師 針으로 殺人’에서는 무자격 의료행위에 의한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사용되었고 ‘가짜치의(齒醫)’ 명칭도 비슷한 시기 언론에서 사용된다.3)) 위 용어는 모두 무자격자의 진료 행위를 언급하는 것으로 수술보다 진료에 관한 부정행위가 먼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부정한 수술 대체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는 이보다 훨씬 뒤에서야 나타나는데 대리수술이 먼저 사용되었다. 1997년 10월 22일 동아일보 기사 “환자마취 후 수술의사 교체, 수억 대 특진비 챙겨” 기사에서 특진 의사의 수술을 다른 의사가 대신한 사건에서 대리수술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다. 대리(代理)는 대리시험, 대리출석, 대리투표, 대리모, 대리점, 대리운전, 과장 대리 등 타인을 대신한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기 때문에 대체적 수술 행위가 즉각적으로 연상되어 의미 전달이 쉽다. 후속 보도에서 ‘의사 바꿔치기’ 용어도 등장하는데 수술의 경우 대리수술로 표기하고 진료의 경우는 의사 바꿔치기 혹은 ‘대리진료’ 용어를 사용하였다.4))
의료사건에서 ‘유령’ 용어는 오히려 가짜환자를 지칭하는 ‘유령환자’가 먼저 언론에 사용되었다. 1953년 3월 18일 조선일보 기사 “유령환자(幽靈患者) 만들어서 한몫 본 직원들 문초(問招)”에서 병원직원의 횡령 사건을 다루며 처음 사용하였다.5)) 이후에는 주로 의료보험 청구와 관련된 병원의 부정행위를 언급할 때 유령환자 단어가 사용되는데 실체가 없는 장부상의 가짜 환자를 지칭한다. ‘유령수술’은 ‘ghost surgery’의 번역어로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었기 때문에 용어에서 누군가 몰래 수술을 대신했음을 바로 알아챈다. 국내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유령’ 단어가 풍기는 음지에서의 은밀한 느낌 때문에 언론에서도 선호하였다.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여고생 환자의 뇌손상 사건이 발생하자 2014년 4월 10일 성형외과 의사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와 자정을 결의한 일이 있었다. 본질은 기업형 성형외과의 공장식 수술에 대한 성토였는데 이를 언론에서 보도하며 유령수술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때 신문마다 대리수술, 유령수술, 유령의사, 쉐도우 닥터 등 여러 용어를 섞어 사용하였고 경향신문은 “유령의사가 대리수술” 기사에서 유령과 대리를 섞어 사용하기도 하였다[2−4]. 한국의 의료 사건에서 유령 용어는 유령환자(1953), 유령의사(2009)6)), 유령수술(2014)의 순서로 언론에 등장한다.
유령과 비슷한 어감으로 ‘그림자 의사’가 있다. 이는 서구 문헌에서 사용되는 ‘shadowing a doctor’, ‘doctor shadowing’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실제 서양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Shadowing’의 본래 뜻은 그림자처럼 스승이나 선임을 따라다니며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학습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도제(徒弟)적 교육 방식이 의학교육에서 역사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며 대체 수술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 용어는 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적확한 용어라 볼 수 없다.
용어의 최종 선택지로 많이 사용되는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용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용어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한 국내 문헌에서 대리 용어는 합법적 행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1]. 결론적으로 유령수술이 그나마 적절한 용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로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며7)) 외국의 문헌에서도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사법 분야에서 ‘대리’ 용어는 ‘agency’의 뜻으로 합벅적 대행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대리 용어가 사용될 때 위법적, 합벅적 사안을 모두 포함하는 중립적 의미로 사용된다. 실제로 ‘대리운전’, ‘대리모’, ‘과장대리’ 등에서는 가치 중립적이거나 합법적 의미로 해석되지만 ‘대리시험’, ‘대리출석’ ‘대리투표’ 등에서는 부정(不正)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대리 용어를 합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률 분야에서의 인식에 가까우며 일반적인 정의로 해석하기 어렵다. 반면에 우리말에서 ‘유령’은 유령회사, 유령단체 등 위법적 사안에서 가짜 혹은 부정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유령’ 단어 자체의 음성적이고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의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대체적 행위를 다루기에는 오히려 적절치 않아 보인다. 즉 사법 분야에서는 대리 용어가 합법성을 시사하여 면죄부를 부여하는 혼선을 줄 수 있으나 일반대중에게 유령 용어는 오히려 면죄부보다는 음성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한다. 일부에서는 대체 행위자의 자격에 따라 대리수술, 유령수술을 분리해서 사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즉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나 의사 이외의 의료인 등 수술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8))에게 수술을 대행케 한 경우를 ‘대리수술’로 정의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경우를 ‘유령수술’로 정의하는 방법인데 이 역시 합의된 사항이 아니어서 더 큰 혼선을 줄 수 있다[5]. 두 가지 용어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의사 대체’ 혹은 ‘대체 수술’ 등 새로운 용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사회에서 통용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것이므로 특정 분야에서의 쓰임에 따라 선택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 시점에서 언론은 유령수술보다는 대리수술 용어를 보다 많이 사용한다.
또한 의료에는 여러 대체적 부정 행위들이 발생하는데 처방과 진료에는 ‘대리처방’, ‘대리진료’를 사용하고 수술의 경우에는 ‘유령수술’을 사용하는 것도 어색하다. 위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오랜 기간 사용되어 익숙하고 대중에게 중립적인 의미로 쓰이며 우리말로 의미 전달이 분명한 ‘대리수술’이 적확한 용어라 사료된다.
언제부터 대리수술이 시작되었나? 대리수술은 현대의학의 전신마취 기술이 시작된 이후 줄곧 있어 온 것으로 추정되지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 기록을 찾기는 어렵다. 오래된 역사를 가졌지만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엄정해졌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 자주 보도되는 것 뿐이다. 수술 결과가 좋으면 문제 삼지 않는 정서도 대리수술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대리수술은 경력이 떨어지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을 갖춘 의사의 이름을 빌려 수행하는데 간혹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문학에는 간혹 대리수술의 장면이 묘사된다. 서구의 픽션에 등장하는 대표적 장면은 레마르크의 소설 “개선문”에 등장한다. 나치 정부를 피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수술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경우 환자는 오히려 실력 있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행운을 누린다.9)) 한국의 문학으로는 황석영의 ‘한씨연대기’에 유사한 장면이 등장한다. 소설 속에는 식민지 시기 교토대 의학부를 유학한 엘리트 의사가 전쟁과 분단에 휘말리며 무자격자 의사를 대리하고 의료사고를 수습하는 상황들이 묘사되어 있다.10)) 미국사회에 대리수술의 문제를 널리 알린 계기는 1970년대 일어난 기구회사 영업사원의 사건이다.11)) 1975년 뉴욕주의 스미스타운 병원(Smithtown General Hospital)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고관절교체수술(total hip arthroplasty)에 기구회사의 영업사원이 참여한 사건이다[6]. 정형외과의사 David E. Lipton과 Harold Massoff는 인공고관절(artificial hip prosthesis) 교체 후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것을 회복실에서 발견하고 다시 수술실로 옮겨 재수술을 시도하게 된다. 느슨해진 인공관절을 다시 고정하려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이미 퇴근하여 골프를 치고 있던 영업사원 William Mackay를 호출하였고 수술실로 돌아온 Mackay는 삽입된 인공고관절을 제거하고 새 인공관절을 다시 삽입하여 수술을 마무리한다. 45세 환자 Franklin Mirando는 수술 후 다리를 절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결국 1980년 100만 불의 배상 판결로 마무리 되었다. 사건 당시 수술 전 Mackay의 참여에 대한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고 그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으며, 일절 의료에 대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자격자(당시 표현으론 layman) 영업사원이라는 사실만이 언론에 크게 부각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관절용 의료기회사 직원들이 광범위하게 수술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The Assembly’s Medical Practice Task Force)가 구성되었다. 위원장이던 Matthew Lifflander는 Mackay가 정식 교육도 받지 않고 자격증도 없지만 탁월한 손재주의 소유자라고 밝혀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또한 병원 측 변호사는 당시 관절 기구회사의 영업사원들(detali men)이 수술에 참여하는 것은 40년 이상 오래된 관례이며 부정한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였다[7−11]. 위원회는 1978년 조사 결과로 ‘Lifflander report’를 발표했다. 뉴욕주 35개 병원의 40명의 의사를 인터뷰한 보고서는 뉴욕주 교육병원에서 시행하는 수술의 50%−95%가 전공의(resident)에 의해 이루어지며, 대부분은 집도의(operating surgeon)가 세밀하게 지도하지만 일부는 지도, 감독 없이 이루어지며 수술전 이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 과정이 없음을 보고했다. 결국 이 사건은 ‘집도의는 수술 참여자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만들어지는 출발점이 되었다[12]. 다음은 한국에서 대리수술이 알려지게 된 계기이다.
물밑에서 관습처럼 이어지던 대리수술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계기는 2016년에 발생한 故 권대희 군의 사망 사건(이하 권대희 사건)이다.12)) 2016년 9월 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술을 받던 25세의 청년은 수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였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49일 후인 2016년 10월 26일 사망하였다. 한 명의 성형외과의(피고인 A, 원장)와 마취의(피고인 B)에 의해 몇 건의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두 명의 의사는 수술이 끝나기 전에 환자의 수술실을 떠났으며, 수술의 마무리 작업(세척, 봉합)은 다른 의사(피고인 C)에 의해 이루어졌고, 출혈에 대한 관찰과 압박지혈 작업은 간호조무사(피고인 D)에 의해 이루어졌다. 출혈로 위급해진 환자가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채 처치가 지연되고 뒤늦게 이송되는 과정이 CCTV를 통해 기록되었고13)), 영상 자료가 재판과정에서 공개되며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14)) 재판은 상고를 거듭한 끝에 2022년 1월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이루어졌다. 업무상 과실치사죄 외에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의사 2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이유이며 간호조무사는 이를 시행했기 때문이다.15))16)) 하지만 간호조무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외에 타 의사에 의한 수술의 대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재판 과정에서 심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야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져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17))
이 사건은 수술실 CCTV를 의무화했으며 무면허 행위를 지시한 의사에 대한 처벌 등 수술 관리와 관련된 많은 조항을 엄격하게 바꾸었다[13]. 하지만 이 사건은 의료에서 일어나는 여러 유형의 대리수술 중 하나일 뿐이며 한국의료 현장에는 병원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대리 수술이 존재한다. 동의받은 의사를 대리하는 주체의 자격에 따라 분류하여도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허가된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 범위 안이지만 동의받지 않은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다. 고난도의 수술일수록 여러 사람의 협업에 의해 수술이 이루어지는데 절개, 봉합, 지혈, 견인 등 행위의 종류가 다양하며 도움의 범위와 교육상 집도의의 지도 형태도 다양하여 복잡한 양상을 띤다.
동시대 한국의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리수술은 매우 다양하여 전체를 한 단어로 정의하기도 어렵다. 대리수술의 목적에 따라 병원의 성격에 따라 대리하는 주체도 다양하다. 대리수술의 목적은 크게 영리, 효율, 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크게 부각된 기업형 성형외과에서의 대리수술과 척추 전문병원에서의 대리수술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병원을 대표하거나 이름이 알려진 의사는 자신의 역량과 규모를 넘어서는 많은 환자를 유치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조 인력을 이용한다. 보조 인력에는 의사도 있지만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보건의료인도 포함되며 때로 행정직원이나 의료기 사원 등 무자격자가 동원되기도 한다. 일정한 시간에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 수술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환자 유치 업무와 수술 업무를 분리하는 분업 형태를 통해 극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때로는 효율을 목적으로 이뤄진다. 경험 많은 집도의가 절개에서 봉합까지 수술의 모든 과정을 수행할 경우 많은 수술을 해내기 어렵다. 비효율적이며 사회적으로도 손실이기 때문에 보통 대학병원에서 집도의는 주요 부위와 단계만을 수술하고 나머지는 보조 인력이 담당한다. 하지만 이 경우 영리와 효율의 경계는 모호하여 의도에 따라 영리 혹은 편리가 언제든 효율이나 교육으로 포장될 수 있다. 수술 교육 목적의 지도는 의료의 지속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18))에서는 외과 분야의 전공의나 전임의19))가 집도의의 수술을 보조하며 술기와 경험을 연마한다. 외과의사가 양성되는 보편적인 교육 방식이다. 하지만 전공의나 전임의의 수술 참여와 보조 범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규정할 지침등이 미비한 상태이다.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 법적 판단 과정에서 밝혀진 다른 의사의 수술 참여는 또 다른 분쟁을 낳는다. 수술실 CCTV가 의무화 된 현 상황에서 일정한 지침없는 전공의 수술 행위는 논란의 가능성이 작지 않다. 수도권의 대형병원들은 부족한 전공의의 공백을 전임의 인력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외과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속칭 ‘전공의 법’20))이 시작된 이후 전공의의 근무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도 대리수술의 동기가 교육에서 효율이나 영리로 전환되는 상황의 하나이다.
한국 의료에서 일어나는 대리수술의 유형을 대리 주체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하려 한다.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며 앞서 언급했듯이 이를 기준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대리수술을 표준용어로 해서 대리하는 주체에 따라 1) 무자격자의 무면허 대리수술, 2) 보건의료인의 무면허(면허 외) 대리수술, 3) 비동의 의사 대리수술로 분류하고 명명하였다(Table 1).
의료에 관하여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비 보건의료인21))의 대리수술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주로 의료기업체의 직원이나 병원의 일반직원(행정직원, 오더리22))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형태는 과거 중소 규모의 정형외과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관절, 척추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일어난다[14]. 규모나 의사 수에 비해 많은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일수록 병원의 영리 추구 성향이 크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23))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현행법에 의한 처벌에서 업체 직원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지시한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며 병원은 영업정지 혹은 개설 취소된다[15]. 의료기 업체의 직원에 의해 대리 수술이 이루어지는 연유는 다음과 같다. 관절이나 척추 등 뼈에 인공 보철물을 삽입하는 수술의 경우 업체 직원이 보철물을 납품하며 사용법을 의사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있는데 회사마다 혹은 보철물의 종류마다 사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뼈에 볼트와 너트 등의 스크류와 금속 플레이트 등의 보철물을 삽입 고정하는 기술은 마치 목수가 행하는 작업과 유사하여 많이 다뤄보거나 손재주가 좋을수록 잘하게 마련이다. 이를 수술에 참여하여 설명하고 직접 시범을 보이는 과정이 변형되어 의사의 묵인하에 대신 수술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의사가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직접 지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많이 알려진 의료기 직원의 대리수술 사례로는 2018년 부산의 정형외과 병원에서 일어난 수술 후 뇌사 사건이 있다. 의사는 의료기 영업사원에게 어깨 수술을 대신 시켰는데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뇌사상태에 빠졌고 한 달 만에 사망했다. 부산에서는 2013년, 2015년에도 의료기직원에 의한 대리수술 사건이 적발됐는데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던 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크게 부각되었다[16−18].
병원 일반직원에 의한 무면허 대리수술의 경우는 의료인이 아닌 보조인력이 반복적으로 수술에 참여하다 일상화된 유형으로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행에 익숙해지면 불법성에 둔감해지고 편리함에 익숙해져 오랜 기간 지속되어도 수술 결과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잘 드러나지 않는다. 최근의 사례로는 2021년에는 인천의 척추 전문병원 사건이 있는데 수술실 영상이 공개되었다. 영상에는 행정직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수술하는 장면이 담겨 있으며 정황상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이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자주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척추수술의 특성상 척추마취하에서 환자의 의식은 깨어 있으나 엎드린 자세에서 수술천으로 가려져 있어 환자는 의사를 직접 볼 수 없다. 수술 중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말을 거는 사람은 짧은 시간 머무른 의사이고 행정직원은 침묵을 지키는데 이러한 방식이 암묵적으로 약속된 것임을 시사한다. 의사를 포함하여 관계자 전원이 구속되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감형되는 등 처벌의 수위가 논란이 되었다[19]. 사건에서의 법적 판단과 처벌의 경중은 수술 대리자의 자격 혹은 면허에 따라 결정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뢰에 대한 배반감이 주요 정서인데 이는 힘들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찾아 선택했는데 질적 수준을 알 수 없는 서비스 상품이 자신의 신체에 가해졌을 때의 낭패감이다. 거기에 만일 대리자가 무자격자일 때는 더욱 충격이 클 수 밖에 없고 의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그 외에 무면허 대리시술로는 무면허 업자의 치과치료가 있는데 환자의 동의하에 이뤄진다는 면(unlicensed and authorized)이 앞의 경우와는 다르다. 무면허 업자의 미용시술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 두 경우 모두 시술자가 무자격자임을 환자가 알고 있지만 저비용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이다. 전신마취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환자 몰래 임의로 의사를 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각 면허의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수술행위를 지칭하며 여기서는 ‘면허 외‘라는 용어를 병용하였다.24)) 병원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 위생사 등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 면허 외 대리수술을 논의하려면 우선 용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법은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을 다르게 정의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3항에서처럼 의료인을 포함 폭넓게 정의하며 의료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의료인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만이 포함된다. 의료법 제27조 ①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데 의사 이외의 의료인에 의한 단독 수술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허 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규정하려면 면허된 의료행위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을 정의하며 의료인의 면허 종별에 따른 업무수행 범위를 명기하지만25))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의료행위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의료인 혹은 보건의료인이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서 수술이나 시술을 행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부족한 의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도 많다. 가장 많은 경우는 의사에 의해 병원에 고용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사가 의사의 수술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일반직원의 무면허 대리수술을 의사 외 보건의료인이 대신하는 형태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관행화된 경우가 많으며 대리자가 병원 의사에 의해 고용되어 일하지만 실제적으로 공생적 분업관계인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법적 처벌도 사례에 따라 복잡한 양상이다.26)) 이 역시 반복적으로 수술에 참여하던 간호조무사 등이 보조 수준의 참여를 넘어서서 수술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이다. 수술의 주요 부위까지 모두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주요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행하는데 이 경우도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 의사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보건의료인의 면허 외 수술의 다른 형태는 앞서 무면허업자의 미용치료와 유사한 사례들이다. 무면허업자를 보건의료인이 대치한 형태이며 독립적으로 한 장소에서 혹은 이동하면서 시술을 시행한다. 이 경우 역시 환자는 의사가 아님을 알면서도 저비용 때문에 이용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경우는 대학병원 PA간호사(physician assistant)와 관련된 갈등이다. 이 경우는 전공의 인력의 부족으로 시작되었으며 수술의 주요 부위를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창상 봉합 등 전공의의 역할 일부를 수행한다. 오랜 기간 수술 보조인력으로 활동한 PA간호사가 수술의 주요 과정이 끝난 후 수술을 마무리할 때 창상을 봉합하는 행위를 면허를 벗어난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으며 의사들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 대학병원의 외과분야 중 전공의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수술을 보조할 유일한 인력이 PA간호사 뿐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남자 간호사의 증가로 많은 대학병원에서 남자 간호사를 수술실의 PA간호사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업무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여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논란으로 의사가 하던 심장초음파 검사를 보조 인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는 부족하고 검사와 시술이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유형의 논란은 보건의료인의 면허 범위 해석과 관련되어 있으며 의료의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의료인과 여러 보건의료인 각각 직역이 갖는 권한과 관련되어 있으며 환자 안전보다는 배타적 권한을 중심에 둔 갈등인 경우가 많다[20,21](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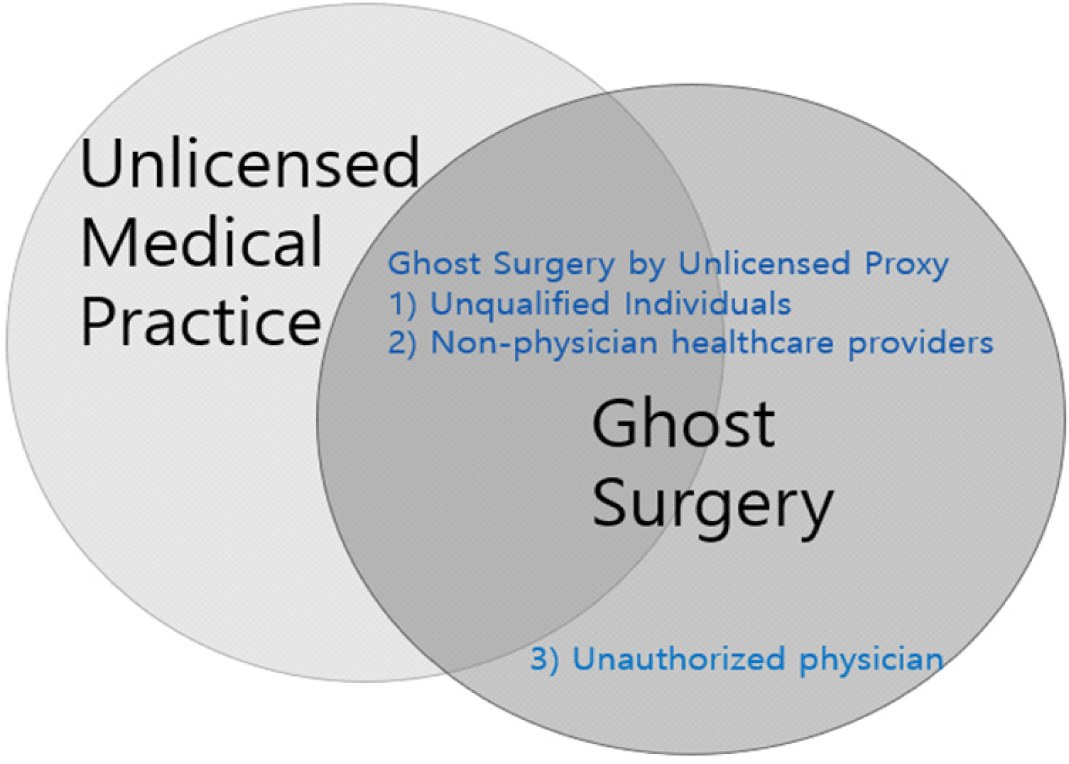
앞에서 언급한 대리수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경우 보건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술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여기서는 사전에 동의받지 않은 의사에 의해 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다룬다. 이 경우 법적 처벌도 모호하여 사건 판례에서도 의료법이 아닌 형법상의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27)) 가장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유형은 성형외과의 대리수술이다. 환자를 상담하고 동의받은 의사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를 달리하는 형태이다. 앞의 경우와 비슷한 분업방식으로 대표 의사는 진료실에서 환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수술실에선 고용된 의사들이 공장처럼 수술하는 방식으로 효율과 이윤을 극대화한다. 수술자의 자격도 성형외과 전문의가 대리하는 경우와 훈련받은 다른 전공분야의 전문의나 일반의가 대리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비동의 의사의 대리수술의 경우는 크게 전문의가 대리하는 경우와 전공의가 대리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상급자인 교수의 지시하에 전임의나 수석 전공의28))가 수술을 대리한다. 수술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지만 상급자인 교수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적절한 지도나 감독 없이 전임의나 전공의에게 수술을 대리시킬 경우 동의 절차를 위배하는 문제와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를 동반한다. 최근 알려진 대학병원의 대리수술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 대형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사전동의 없이 후배 의사에게 3건의 수술을 맡기고 해외학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사건으로 내부고발자에 의해 알려지고 해외 출입국 사실에 의해 증명되었다. 이 사건은 개인 병원뿐 아니라 특진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병원에서도 대리수술이 일어난다는 취지로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다[22]. 대신 수술을 맡은 의사는 전임의 신분으로 이러한 방식은 대학병원에서 젊은 의사에게 수술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목하에 오래전부터 있어 오던 방식이나 현재는 의사 사회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방식으로 여겨진다.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교수들이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후배 교수에게 수술을 대리시킨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전공의에 대한 폭행과 관련되어 고발되었으며 경찰 조사 후 검찰에 넘겨졌으나 불기소처분되었다[23].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도 전공의들이 교수의 대리수술을 고발하며 진료기록을 증거로 검찰에 제공한 사건이 있었다. 이 경우 수술을 대리시킨 교수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전공의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양측 모두 기소되었으며 전공의에 대해서 대법원은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24].
하지만 대학병원의 경우 대리수술은 최근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회 분위기 변화에 따라 환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의사들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및 소송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도 한 요인이며 반면에 전공의 역량에 대한 교수들의 신뢰가 감소한 것도 작용한다.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하고 젊은의사들의 성향이 바뀌면서 과거처럼 헌신적이고 투지있는 외과 지망생이 줄어들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한 규제가 먼저 시작된 미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25]. 또한 다양한 구성원이 수술에 참여하는 대학병원의 경우 간호사, 마취의사, 전공의, 학생 등 다양한 관찰자가 있는 것도 이유이다. 실제 대학병원의 의료사고 소송의 경우 많은 사람이 입을 맞추는 담합이 일어나기 어려우며 많은 내부 제보자가 등장한다. 구성원들의 상호감시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 의료의 대리수술 규모는 알기 어렵다. 대리수술이 한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던 2020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적발된 건수를 64개월간 112건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는데 수치를 신뢰할 수는 없지만 위에 설명한 세 가지 유형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된다[26].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도 보편적 교육 과정이지만 때로는 대리 수술로 오해받을 수 있다. 수술실 감시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교육 목적의 수술 참여가 의료소송 과정에서 대리수술로 판단받을 수 있다. 전공의 수술교육과 대리수술의 경계에 관해 들여다보려 한다.
사람들은 수술의 전 과정을 진료한 의사(대학병원의 경우 담당 교수)가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 복잡한 수술일수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숙련된 보조자가 여럿 필요한데 이 역할을 전공의가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공의 수술 참여는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된다. 전공의는 젊고 의욕적이며 집중력이 높은 세밀한 관찰자이기 때문이다. 집도의의 지시를 따라 수술을 도우며 때로는 눈에 띄지 않던 위험 요소들을 발견하고 조치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수련병원의 외과 분야 전공의들은 다양한 수술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아간다. 이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판단 능력을 길러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위치를 바꿔 후학을 지도하는 교육자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외과 의사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스승을 보조하거나 대리하며 수술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데 이는 전 세계 공통의 교육방식이다. 하지만 참여 정도에 따라 대리수술과의 모호한 경계 지점이 존재한다. 전공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히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갈등 원인이 되고 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필수분야 의사 양성에 닥친 위기와 수술실 영상감시 등이 일상화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는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29)) 전공의들의 진료 참여는 수련병원만의 특별한 장점이지만 적절한 교육과 지도가 없으면 반대로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우선 전공의 외과 교육 지침에 대한 외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 의료환경에 맞는 지침을 모색하려 한다.
미국의 경우 전공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병원마다 자체적인 규정을 구비하고 있는데 수술실에서의 교육에 대한 지침과 지도 방식도 포함되어 있다. 각 병원의 전공의 프로그램은 의사들의 졸업 후 교육을 총괄하는 ACGME(Accreditation Council of Graduate Medical Education)30))의 규정과 지침을 기초로 하며 수술 교육 지침 역시 ‘ACGME program requirements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in general surgery’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지침은 6가지 목차(oversight, personnel, resident appointments, educational program, evaluation, the learning and working environment)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항목마다 이를 뒷바침하는 교육 철학을 설명하고 있다. 이중 ‘교육 및 근로 환경(the learning and working environment)’ 부분에 환자 안전, 역량 발달, 수술 지도 방법 및 책임(patient safety, quality improvement, supervision, and accountability)을 명시하고 있다[27]. 핵심적으로 전공의가 독립적인 수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졸업 후 연차(post-graduate year, PGY)나 개개인의 발전 속도에 따라 단계별로 훈련하는 것을 기조로 하며 수술 교육에서 담당 전문의(attending doctor)31))가 지도 감독(supervising)하는 방식을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1) 직접 감독(direct supervision): 담당 전문의가 수술실에 머물며 지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직접 수술대에 참가하며 지도하는 경우(scrubbing)와 수술 테이블 뒤에서 관찰하며 지도하는 방법이 있다. 신입 전공의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반드시 직접 감독이 필요하다.
-
(2) 간접 감독(indirect supervision): 수술실 밖에 있으나 언제든 수술 참여가 가능한 위치에 대기하며 전화나 영상으로 지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대기하는 장소는 병원 안과 밖 모두 가능하다는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취하지만 필요 시 수술 참여가 가능한 가까운 거리여야 한다.
-
(3) 수술 후 검토(oversight): 수술 후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감독 방법이다.
전공의의 발전 단계와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담당 전문의가 판단하여 지도 방법을 선택한다. 간접 감독이나 수술 후 검토를 택하면서도 환자 안전을 도모하려면 담당 전문의는 수술실에 언제든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함을 최소한의 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술 전에 환자의 상황과 수술 부위의 상태에 따라 수술의 방향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있어야 하고, 수술 중 수술실 밖의 전문의에게 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시설적 장치와 분위기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좋은 사례로 미국 노스웨스턴 의과대학 외과의 지도 지침(Guidelines for supervising residents, Northwestern Univ. feinberg school of medicine, Dept. of surgery)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28]. 우선 수술의 단계를 다음 6단계(a framework of six phases of operation)로 세분하였다. 1) 마취 유도(induction of anesthesia), 2) 절개(initial incision), 3) 진단 확인(confirmation of the original diagnosis), 4) 수술 집행(technical execution of planned procedure), 5) 봉합(closing the wound), 6) 마취 회복(reversal of anesthesia). 크게 지도 방식은 각 수술의 단계와 전공의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수술 과정에서 기술적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직접 지도할지(degree of personal technical assistance)는 담당 전문의의 재량에 따른다.
담당 전문의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의의 경력 및 역량, 수술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이를 결정한다. 책임 지도전문의는 수술의 모든 단계 동안 수술실에 즉시 도달 가능하도록 몇 분 이내의 거리에 대기해야 하며 수술의 주요 단계(critical phases)32))에서는 직접 현장에 참석해 있어야 한다. 각 년자별 지도 지침은 다음과 같다.
피부 절개와 봉합, 내시경 포트 삽입 또는 창상 드레싱 등도 담당 전문의나 지시를 받은 고년차 전공의가 직접 지도하여야 한다. 단순 술기 중 근막 봉합이나 포트 삽입의 지도는 최소 3년차 전공의가 담당해야 한다. 이보다 복잡한 술기는 4, 5년차 전공의가 직접 지도 감독해야 한다.
개별 증례의 난이도와 해당 전공의 숙련도를 고려하여 담당 전문의가 승인할 때는 절개 및 봉합, 포트 삽입, 상처 괴사조직 제거 등의 과정을 간접 감독하에 수행할 수 있다. 이보다 복잡한 수술 단계는 담당 전문의나 전공의 4, 5년차, 전임의(펠로우)의 직접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개별 증례의 난이도와 해당 전공의 숙련도를 고려하여 담당 전문의가 승인할 때는 절개 및 봉합, 수술 시야 확보, 포트 삽입, 괴사조직 제거 등의 과정을 간접 감독하에 수행할 수 있다.
4, 5년차 전공의는 비주요 부위를 수행하는 저년차 전공의를 감독할 수 있다.
출혈과 같이 즉각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4, 5년차 전공의가 담당 전문의에게 통보한 후 환자를 수술실로 이송하여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다.
요약하면 저년차 전공의의 경우 담당 전문의나 고년차 전공의가 거의 모든 단계에서 같이 참여하여 지도하고 고년차의 경우 담당 전문의의 판단하에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술기를 수행하게끔 교육하는 방식이다.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좋은 외과의가 양성되기 위해선 전공의 수술 참여에 대한 사회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의료가 투명하고 신뢰가 두터울수록 수술 과정에 대한 오해가 적으며 균형 잡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전공의 교육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가장 잘 되어있는 미국의 경우도 전공의 수술 참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예상보다 높지 않다. 한 조사에 의하면 외과 교수들은 환자가 수술에 동의할 때 전공의 수술 참여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동의하는 것으로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반면 전공의가 수술의 중요 부위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환자의 비율은 8% 정도 수준으로 낮다. 환자들의 많은 수는 전공의는 수술에 있어서 보조적이고 주변적인 역할만 수행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 한 수술 대부분을 주치의가 집도한다고 생각한다[29]. 또한 높은 의료수준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료에 대한 대중 전반의 신뢰 수준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민간보험 중심의 의료체제로 인한 낮은 접근성과 높은 수준의 상업화가 의료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한국은 영리병원이 금지되어 있고 공공보험 중심으로 운영되어 의료 상업화를 억제하는 제도적 기반은 갖췄졌으나 민간병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공공보험의 낮은 보장성이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30]. 수술실 영상감시가 대중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일련의 상황을 보더라도 한국 의료와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결코 높지 않음이 분명하다. 일련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술 지도와 관련한 국내 전공의 수련규정을 살펴보고 수술 침의 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전공의 수련병원은 병원별로 교육수련부를 두고 전공의 ‘수련 규칙’(또는 수련 규정)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다. 세부 전공별로는 각각 ‘수련지침서’를 마련하여 전공별로 근무내용, 교육내용 및 평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33)) 통상 외과 분야의 수련지침서에는 각 시기별로 달성해야 하는 일반 수기와 수술 목록 등의 성취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만 수술실 내 교육에 있어서 지도 전문의가 지켜야 하는 지도 감독 방식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전공의 수술 참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 및 체계적인 외과 교육을 위해 수술 지도감독에 관한 지침이 필요한 때이다. 앞서 설명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수술 지도감독 지침 중 세부 내용은 각 병원별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우선적으로 ‘수술 지도감독에 관한 일반 원칙’(이하 수술 지도 원칙)을 제시하였으면 한다. 우리 환경에 맞는 수술 지도 원칙을 마련할 때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수술 중 담당 전문의의 위치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술 지도는 전공의의 숙련도와 수술의 단계에 따라 직접 감독하는 외에도 간접 감독이나 수술 후 감독이 있는데, 이때 지도 전문의34))의 위치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고 외과교육과 대리수술과의 경계가 모호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도 전문의의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선 수술실 공간과 구조에 관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병원에서 ‘수술실’ 용어가 가리키는 공간은 수술이 이루어지는 개별 방을 의미하지만, 여러 개의 방을 포함하는 전체 수술용 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병원의 여러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는 대부분 서구의 용어를 한국식으로 조어(造語)한 것이며 수술 공간 역시 마찬가지다. 수술실(手術室)에서 ‘실’은 방실(傍室)을 의미하여 독립된 개별의 방을 의미한다. 이는 operating room 혹은 operating suite에서 유래한다. 수술실 전체 공간을 지칭할 때는 서양에서는 operating theater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수술실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할 때 혼선이 발생한다. Theater는 한국어로는 지붕이 있는 개별의 독립된 공간을 의미하므로 ‘동(棟)’ 혹은 ‘장(場)’으로 지칭하는 것이 정확하다. 여기서 동은 병원에서 개별 입원 공간인 병동(病棟)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된다. 따라서 전체 수술 공간을 지칭하는 경우 ‘수술장(手術場)’ 혹은 ‘수술동(手術棟)’으로 지칭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개별 수술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수술실’ 혹은 ‘수술방’으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수술장과 수술실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려 한다. 요약하면 담당 전문의의 위치는 병원 외, 수술장 외 병원 내, 수술장, 수술실, 수술대35))로 나눌 수 있다.
수술 지도 원칙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덕목은 환자 안전이며 그 다음이 체계적인 수술 교육이다. 규정할 내용은 1) 분야별 지도 지침 숙지에 대한 지도 전문의와 전공의의 의무, 2) 수술의 최종 책임자, 3) 동의서에 참여 전공의 서명, 4) 수술의 단계와 전공의 년차별 지도 감독의 방법, 5) 담당 전문의 위치 등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수술 지도 원칙을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지도 전문의와 전공의는 각 분야별로 작성한 수술 지도 지침을 숙지해야 한다.
-
수술의 지도 전문의(혹은 담당 전문의)는 수술 전 과정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다.
-
수술 전 환자에게 전공의 참여 여부를 알려야 하며 참여 전공의는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수술 과정을 ① 마취 유도, ② 절개, ③ 진단 확인, ④ 수술 집행(주요 부위 수술 포함), ⑤ 봉합, ⑥ 마취 회복의 6단계로 분류하고 단계에 따라 지도 방식을 달리한다.
-
지도 전문의와 전공의는 수술을 수행함에 있어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
수술실 내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응급상황(life threatening emergency)의 경우 지도 전문의가 가능한 즉시 개입해야 한다. 담당 전문의가 수술실 밖에 있는 경우는 누구든 최상급자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도 전문의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지도 전문의와 전공의 모두가 각 전공별로 마련된 수술 지도 지침을 잘 알고 원칙대로 대처해야 다양하고 예외적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택할 수 있다. 전공의 참여의 사전동의에 대해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의료법(법률 제20593호, 2024.12.20., 일부개정)은 제24조 2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 수술 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중에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을 명시하였다. 또한 제4항에서는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36)) 따라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할 때 수술을 책임지는 담당 전문의뿐 아니라 참여하는 주된 전공의의 이름을 알리고 이들 모두 서명해야 한다. 현재 모든 수련병원에서 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항목만을 골라 수술 지도 원칙을 작성했음에도 이를 엄격히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대학병원의 지도 전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량이 많고 환자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수술중에도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의 응급 상황에 대해 대처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각 수련병원은 일반 원칙을 고려하여 전공의 수술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지도 전문의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본 원칙은 수술의 난이도와 단계, 전공의의 역량에 따라 지도감독의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사례별로 복잡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지침에 규정하기 어려우며 지도 전문의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야 한다. 또한 전공의 수련기간이 전공에 따라 달라 각 전공별로 세부 사항을 정해야 한다.37)) 수술실 내에서는 환자 생명과 관련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지도 전문의가 없을 지라도 응급 조치에 즉시 개입해야 하며 최상급자가 마취의사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시한 원칙은 최소한의 규정이며 각 전공 분야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참조하여 병원과 전공 분야에 따라 전공의 수수 지도 지침을 준비하여 조금 더 투명하고 체계적인 수술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III. 결론
한국 의료현장에서의 대리수술은 병원의 성격, 대리 주체,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대리주체의 성격에 따라 크게 1) 무자격자의 무면허 대리수술, 2) 보건의료인의 면허 외 대리수술, 3) 비동의 의사의 대리수술로 나눌 수 있으며, 발생 배경에는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 효율성 강조, 교육과 편의 등 복합적인 동기가 작동한다. 병원의 성격에 따라 대리수술도 달라지는데 무자격자의 대리수술과 보건의료인의 면허 외 대리수술은 척추 및 관절 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비동의 의사에 의한 대리수술은 공장식 성형외과에서 주로 발생한다. 현행 의료법은 무자격자나 비면허자의 수술에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나 의사의 비동의 대리수술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엔 위법성 여부만으로 논의할 수 없는 전공의 문제가 있다. 수련병원에서의 전공의 수술 참여는 현재 일정한 지침없이 운영되고 있어 간혹 외과 교육과 대리수술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놓이기도 한다. 환자 안전과 유능한 의사 양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의료의 투명성과 체계적인 외과 교육을 위해 표준화된 수술 교육 지침이 필요한 시점인데 우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수술 지도 원칙’을 제시해 보았다. 좋은 외과의사를 양성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다.